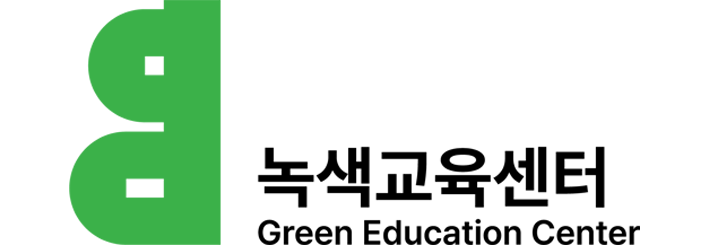| 보석도 같고 초코볼도 같은 누군가의 똥을 파랑 소양샘이 세어보고 있다. 몇알쯤은 먹고 싶을지도. |

길어 길골, 긴 골짜기 옆으로는 이렇게 넉넉하고 편한 길과 터가 있다. 편한 길이라 온갖 야생동물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몇 녀석은 우리의 모습을 어딘가에 숨어 지켜보고 있을지도.

화전민의 돌담. 물이 있고 머물기 좋아 야생동물이 즐겨찾듯 화전민도 이곳에 깃들었더랬다. 80년대 박대통령 시절 쫓겨내려온 삶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누군가 벗어놓은 깜장고무신.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물고 있었을 자물쇠와, 열쇠없이도 이를 열어보려는 녹슨세월의 소리없는 다툼.

한국전쟁 때 쓰였다던 세발수류탄이 물고 있는 안전핀이란 것도 허술해져서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지난 울음을 터뜨릴지 모르니 조심. 숲에서 만난 무기는 만지지 말고 신고만 하시오.
| 당귀꽃 옆에서 달큰하고 씁쓸한 추억에 빠져 파랑새 고대현님은 곰곰히 무얼 곱씹고 계시나. |

어느 작은 동물이 곱게 먹고 간 다래. 두알 남겨 놓았길래 먹어보니 달콤도 하고 시큼도 하다. 우리도 밥 때가 되었구나.

한둔에 대비해 준비해온 주먹밥을 먹으려는데 어딘가에서 킁킁 냄새가. 우리가 오기 전에 멧돼지도 식사를 하고 무언가 부려놓았다. 나뭇가지에 똥을 찔러 냄세를 맡게 해주시는 그림샘의 센스. 소양샘의 물음표 표정.

나무등걸을 타고 오르는 작은 구름들.

네발짐승의 시선으로 올려다보니 더 구름같다. “뿔을 비빅에 굵기는 딱인데 구름이 피었으니 안되겠군.” 영역표시는 남기지 않고 길골 숲을 빠져나온다.

아름드리 전나무 할아버지 안녕.

네발짐승이 된듯 숲을 거닐다가 인간의 길로 접어들면 다시 두발로 선 인간이 되고 만다. 수해에 대비해 너무 높이 박아놓은 데크 길을 지나 내려오며 편한 길에 길들어가며 다시 인간의 발이 되는 걸 실감한다.

팬더, 등산화라도 벗자. 뛰어들어 가늠하며 걷는 맛이란 이런 것. 가늠되지 않는 숲길과 물길이라면 과감히 다음으로 연기하시라. 시간과 자연은 언제나 더 멋진 길들을 준비해놓고 있을테니.

| 아슬아슬을 지나면 좋아라~ 신나라~ |

주변에 계시던 다른 분들이 우리의 티셔츠를 보고 외치신다. “맨발로 걸어라!”

함께 가는 길. 다음 번 우리의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