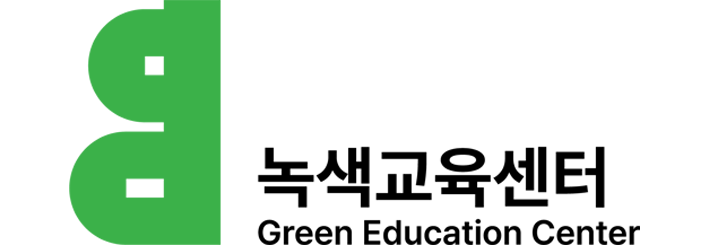다음날 아침 산양연구소를 찾았다. 올때마다 조금씩 내부가 채워지고 있는 이곳 산양연구소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소주에 컵라면에 오염의 온상이었던 백담산장 시절을 기억하니 새롭다. 박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질문가 답이 오가다가 김영준 수의사님의 즉석 강연이 시작됐다. “동물 흔적을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해선 안됩니다. 주변흔적을 살펴야,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양일까 고라니일까? 풀에 난 토끼 이빨자국과 달리, 아랫니만 있고 윗니가 없이 풀을 뜯어먹는 유제목 우제류가 뜯어먹은 풀은 이빨자국이 나지 않는다고. 윗니를 대신하는 치판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히어리 사라씨.

자, 복습. 뛰기 좋게 다리도 길어지고 발바닥을 들고 발톱으로 걷게 되면서 발굽이 된 발가락들이 이렇게 자리잡혀서 쪽발짐승이 되었다는 것. 약지까지 접으면? 말의 발이 되는 것.

누렁이로 불리는 백두산 사슴도 만나 보고 싶다.
진지한 표정으로 사슴 뿔 강의. 뿔이 만들어지기 위해 칼슘, 미네랄 섭취가 필수. 그 때문에 라죠브스키 해변에 꽃사슴들은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어도 죽음을 감수하고 바닷가에 간다고.
너구리 두개골과 개를 구별하는 건 턱힘줄이 가득 찼던 넓은 관자놀이 자리. 닥치는대로 먹는 청소동물 너구리는 턱힘이 좋다. 야생동물의 생김생김과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이유가 있더라.

사슴뿔이 어떻게 생겼는지 헷갈린다면 바로 요렇게~ 따라해보세요. 얼레지 주연씨가 뿔났다?

산속에서 야생동물을 만났다면? 앗, 하늘다람쥐다 외마디 비명이거나 사진 포즈라도?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만나면 겁먹지만,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멧돼지는 판단과 행동이 빠르다. 도망갈 것인가 새끼들을 위해 죽음을 각오할 것인가.
“야생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도 야생동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개골을 보고도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상판이 물결치면 어린개체, 직선화되면 다 큰놈. 이를 별로 쓰지 않아 거친 유치와 많이 쓰고 닳아 둥글둥글해진 이를 보고도 나이를 짐작한다고. 동물도 나이테가 있어서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유류는 보통 전구치단면을 잘라보고, 양서류는 발톱의 단면을 잘라보고 안다고. 뼈는 야생동물의 많은 정보를 전해준다. 꼭 읽어보리라.

산양연구소를 나서려니 비가 떨어진다. 우비소년소녀가 되어 단체사진.

맑고 투명했던 수렴동 계곡, 물이 엄청나게 불었다. 불은 물기둥이 뒤엉키며 내는 포효하는 물소리.

산양에게로 가는 대승골은 물길로 가로막히고. (물길 가까이에 카메라를 덴 쉬리 양기씨)

이 물길 가운데도 전에는 소나무숲이었다고. 수수깡처럼 넘어져 떠내려온 나무들을 정리한다고 군데군데 나무를 잘라 쟁여놓은 인간의 손길은 품삯이다. 지형을 바꿔놓는 물길. 자연의 흐름은 이렇게 때때로 거대하다.

가려진 저 건너 바위틈에 쉬고 있을 산양을 비구름 속에 바라보며. “다음에 만나자.”

네발로 오르는 산양의 길은 막혔지만 대신 길골로 들어섰다. 두발이지만 겸손하게 앞발을 구부리게 하는 숲길. 숲에서는 네발이 되면 더 편하다.

세월을 안고 쓰러진 나무. 잉무든 땅옷을 입은 채 이렇게 곱게 죽음을 살 수 있다면… 참새 김정택님은 무엇을 찍고 계실까?

죽은 나무 등걸에 아주 작은 푸른 숲이 있었네. 이런 작은 생명을 들여다보고 계셨나보다. 숲의 시간을 돌려놓는 작은 동식물들.

촉촉한 숲이면 피어나는 버섯꽃들이 화려하다.

길골을 찾는 포유류들이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달아나 버린 사이 물두꺼비가 대신 비마중을 나왔다.